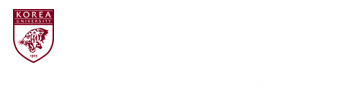연구 제목 :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Science For Policy) 연구 모임
- 연구책임자 : 김규태 (gtkim@korea.ac.kr)
- 공동연구자: 김철규 (ckkim@korea.ac.kr), 이용숙 (yongsooklee@korea.ac.kr), 김동광 (kwahak@empas.com), 김지연 (redgrass@korea.ac.kr), 김명심 (kimshannon@hanmail.net), 김형주 (kim.hyungjoo@gmail.com), 김도현 (nanotube@korea.ac.kr), 고용수 (ddaddom@kistep.re.kr)
- 박근우 (harupho@korea.ac.kr), 최은경 (ekchoi@korea.ac.kr), 박주형 (blue_pierrot@naver.com)
□ 배경과 문제 제기
○ 과학연구에 대한 사회적 영향/공적 투자 문제는 2차 세계대전 무렵 이미 시작됨.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 그린버그(Greenberg, 1967)는 기초연구의 특징에 대하여 (1) 대체로 대학-기반 활동이고 (2) 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며, 그런데 (3) 점차 일반 대중이 원하지 않는 결과(예, 살충제, 원자력 에너지 등)와 연루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함.
- 정치적 선호나 경제적 선호가 변하면, 과학과 정부의 관계는 영향을 받는데, 과학자들은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 연구할 자유(자율성)를 원함.
- 기초연구(basic research)라는 용어는 미국의 컴퓨터과학자 바네바 부시(Bush, V.)의 보고서 “과학-그 끝없는 전선(Science The Endless Frontier, 1945)”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했고, 이후 점차 ‘순수 과학(pure science)’용어를 대체함.

- 구글 N그램 분석(1800-2008)을 보면, 기초연구 용어 사용량은 1950년대 이후 점점 증가하다가, 1990년대 최고점에 도달한 후 점차 하락함 [그림 1에서 검은색 실선] (Kaldewey & Schauz, 2017).
- 순수과학에서 기초연구로의 용어 전환 배경에는, 그동안 과학이 사회/도덕적 규범과 분리되어 왔다는 성찰이 포함됨. 기초연구 용어는 비록 즉각적 실효성은 없더라도 다른 연구의 토대가 된다는 암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타협적 태도를 반영하고 있음.
○ 기초연구 용어의 모호성 문제; 바네바 부시(Bush, V.)는 기초연구를“실제적 목적에 대한 고려없이 행해지는 연구”라고 정의하면서“산업연구”의 대척점으로 성격짓고자 함(Kaldewey & Schauz, 2017). 그러나 용어의 모호성 문제는 계속됨.
- 미국과 영국에 거주하는 과학자와 과학정책입안자 49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연구(Calvert, 2006)에 따르면, 기초연구 과학자(공학자)들 내부에서도 기초연구에 대한 정의는 일관되지 않음. 다만, 과학자들은‘호기심-주도 연구’ 또는 ‘재미있는 연구’, 또는 ‘(효과성)목적이 없는 연구’등의 키워드를 주로 언급함. 기초연구의 이런 성격 때문에 기초연구자와 정책입안자는 항상 기초연구 지원의 정당성을 설명하거나 기초연구의 효과성을 증명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됨.
○ 우리 정부는 1989년을 기초과학연구진흥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 제정함. 정책적 관점에서 기초/원천연구는 유용한 지식의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여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시하고 있는 기초연구에 대한 용어 정의 역시 상당히 넓은 의미로 표현되고 있음. 이 법에 따르면, 기초연구의 정의를‘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학, 의학, 농학 등의 바탕이 되는 기초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 의학, 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 ’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 기초연구의 정의와 지원 범위 문제는 입법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의 원천으로 작용해왔음. 사회적으로 과학은 과학 자체로 존재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기초연구자들도 독자적인 과학 진흥 근거나 정당성을 제시하지는 못함. 그 때문에 과학은 산업과 경제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인식됨(신향숙·문만용, 2020).
○ 기초연구 용어 정의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기초연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강화되어 옴. 이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기능(역할)이 있음.
- 웹오브사이언스 핵심논문집(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이 색인한 과학문헌 말뭉치 분석(1991-2015)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Kaldewey & Schauz, 2017). 각 국의 과학정책도 이를 뒷받침함. 2005년 유럽연구위윈회(European Research Council)는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함. 2011년 한국은 기초과학원(Korea Institute for Basic Science)을 설립하고 기초연구 지원정책을 구체화함.
- 실제 연구 실행에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사이 구분은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는 현대 과학정책이 처한 핵심적 문제(정치적 상황)를 포함하고 있음. 기초연구는 정치적 협상(사회적 가치)과 과학 목표(자율성) 사이의 균형, 그리고 갈등하는 여러 이해관계 사이의 균형을 구현하는데 유용한 용어로 작동하고 있음(Kaldewey & Schauz, 2017).
- 다양한 목표와 복잡한 이해관계들 사이의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용어는 그 자체로‘정치적 행위자(political actor)’로서 기능함. 다시 말해서 기초연구는 ‘실제적 목적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라는 암시(가치)를 내장함으로써(또한 자기 자신에게 그런 사회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이득이 없음’이라는 고유한 취약성을 협상해내고 있음.
○ 국내에서, 기초연구 정책의 주요한 분기점으로“제1차 기초연구진흥계획(2006-2010)” 수립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수 있음. 이 무렵 과학기술 정책은 기초연구 강조, 연구자 자율성, 수요자(국민) 중심이라는 새로운 과학 거버넌스 체계를 형성하고자 함.
- 이는 이전의 과학기술 정책(구 거버넌스)이 국가주도, 전문가 중심, 경제발전 지향이었다는 반성에서 도출된 결과임. 그러나 구 거버넌스의 특징이 완전히 대체되었다기보다는 신 거버넌스의 새로운 목표와 병존하는 양상을 보임(손화철, 2019).
- 정책연구자들은 대체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기초연구정책)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큰 변동은 없이, 경제성장 동력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했다고 평가함. 반면에 이공계 연구자들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중점 사업이 달라져서 다른 과제를 연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평가함. 이처럼 연구자들과 정책전문가 사이에는 시각 차이가 있음.
- 정부는 기초/원천연구의 창조적 역량확보를 위해, 5년마다 기초연구진흥계획을 수립 발표함.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연구현장의 체감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함.
- 종합해 보면, 기초연구 관련 정책은 연구자와 국민 대중 사이에서 적절한 의사소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초연구에 대한 이원적 기대(자율성과 경제적 효과성)로 인해 갈등과 긴장이 상존하고 있음.
○ 정부는 2018년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2022)”를 발표하고,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혁신과 전주기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함.
- 이에 따라 기초연구사업 예산 확대와 생애기본연구 개념 도입함. 기초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대학의 연구역량을 제고하여 기초연구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함.
- 정부 연구개발예산에서 기초연구 비중은 약 40% 수준이고,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2017년 1조 2,697억원에서 2018년 1조 4,243억원으로 확대됨(12.2% 증가).

○ 신거버넌스 체제에서 과학기술 정책은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함. 연구자와 국민의 소통 강화, 신뢰를 바탕으로 성숙한 연구문화 확산을 원칙으로 강조함. 이는 과학기술 정책 체계에서 국민이 수요자의 지위에 있음을 의미함.
- 연구 데이터 공유 강화를 위해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기초연구 성과가 원천기술 확보,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 사회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하기로 함.
○ 그럼에도 기초연구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1) 기초연구의 정의와 범위 문제는 모호하여, 기초연구자/정책입안자에게 사회적 압박과 부담을 주고 있음 (2)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 표방하고 있는 “수요자-공급자 모델”은 수요자(국민)의 체감을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는 연구자의 자율성 문제를 위협할 수 있음.
- 그 외 세부 정책 상, 주요 쟁점으로는 (1)기초연구의 적정 연구비 규모 문제 (2)기초연구 사업으로 양성된 전문인력의 진로 문제 (3)기초연구의 평가 문제 등이 있음.
○ 한편 세계적 환경은 전례없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사회적 전환을 촉발하는 기술변화와 전 세계적인 규모의 기후변화가 이를 주도하고 있음. 소위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와 “예상하지 못한 효과(unexpected effect)”는 이런 상황을 더욱 불확실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있음.
- 정책입안자들과 정치인들은 복잡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해야 하는 큰 압박에 놓이게 됨. 그런데 과학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임. 과학 역시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를 시도하는 중임.

[그림 3] 세부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
- 이런 맥락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성개발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대한 합의가 형성. SDG는 1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SDG의 달성은 개별 주제가 모두 다학제적 노력을 요구하며, 특히 과학연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이는 사회적 의제와 과학연구가 별 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결합하고 협력해야 하는 대규모 연구 영역으로 구현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이상의 문제들은 과학정책의 비전을 사회적으로 형성하고, 이를 실제로 수행(집행)할 역량에 관한 문제임. 새로운 과학정책 모델, 새로운 과학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1990년대, 과학철학 전통에 토대를 둔“과학정책의 과학화(SFP, Science for Policy)”정책 개념이 등장함. 이 정책 개념은 전통적인 결핍 모델(deficit model)과 수요-공급 모델(supply-demand model)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새로운 과학정책 모델로의 변화를 제기함.
- 우리의 과학정책 역사에서 구 거버넌스는 결핍 모델을 토대로 수립되었다면, 신 거버넌스(2005년 이후)는 수요-공급 모델에 근거를 두고 있음. 결핍 모델은 오랜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폐기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두 모델 모두 과학과 정책(사회)을 분리된 별개의 세계로 간주해 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함. 결핍 모델에서 과학 집단이 대중에게 일방향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을 맡았다면, 수요-공급 모델에서 과학은 지식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됨.
- 최근 수요-공급 모델 역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가고 있음. 과학지식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public goods), 암묵지(tacit knowledge) 성격 때문에, 수요-공급이라는 시장 모델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움.
- 과학과 정책 사이 문화적 분리로 인한 한계가 점점 극대화됨. 이는 과학과 정책 사이의 유연한 의사소통, 과학정책에 대한 사회적 동의, 성공적인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informed policymaking)을 어렵게 함. 게다가 그동안 과학정책은 과학의 고유한 성격-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음-을 고려하지 않아 왔음.
○ 과학정책의 과학화(SFP)”, 새로운 과학 거버넌스 모델은 불확실성(Uncertainty)과 의사결정 부담 문제를 해소하려는 기대를 포함함.
- 위험(risk)이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손해라면, 불확실성(uncertainty)은 정량적으로 이득과 손해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질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따라서 불확실성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접근법은 과학만이 아니라 문화적 측면의 개입을 필요로 함(Wynne, 1992; Shackley & Wynne, 1996).
- 정책입안자들이 직면하는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 과학정책의 임무는 단순히 성과를 관리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관리 문제로 전환됨.
- 과학적 사실은 본래적으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 다양한 가치들 사이 논쟁 안에서 형성되며, 의사결정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높은데 의사결정은 촉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이런 맥락에서, 유럽의회 JRC의 최근 연구(Šucha and Sienkiewicz, 2020)에 따르면, 과학연구는 과거의 과학연구보다 의사결정의 부담이 크고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에 과학정책과 전략은 달라져야 한다고 평가함.
- 오늘날의 기초연구는 점점 더 목표갈등이 극심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탈-정상과학(post-normal science)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그림 4 참조]. 정책결정자들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큰 연구에 대한 의사결정을 꺼려할 가능성이 높음. 이를 해소할 방법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과학연구에 대한 정부투자는 뒤로 미뤄지거나, 또는 결정되더라도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 JRC의 과학정책의 과학화(SFP)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과학기술학(STS)의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고 있음. 과학기술학은 시민과학과 같은 공동-생산 모델을 가장 먼저 실험해 왔고, 과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PUS,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에 기반하여 과학 민주주의를 주창해왔음.

○ 국내 과학기술정책 논의로는, 국가혁신체제, 과학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홍형득, 2016), 여전히 과학정책에 관한 학문적 정의와 연구 범위에 대한 합의가 명백하지 않음(이찬구 외 2018).
- 과학정책은 과학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과학정책에 과학기술학(STS) 이론을 적용하려고 시도함. 예를 들어 기술의 사회구성주의(SCOT), 행위자연결망이론(Actor-Network Theory)을 적용한 국가혁신체제 논의가 있었음(박상욱 외, 2005; 이영훈, 2019). 기존의 선형적 혁신체제론에 대해 성찰하고, 공진화 그리고 주체 간 네트워크 상호작용에 주목하기 시작함.
□ 과학기술정책 기반(프레임워크) 마련;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 현재의 과학기술(기초연구)을 둘러싼 문제 상황(불확실성 관리)은‘연구자의 자율성’과 ‘사회적 정당성(국민체감)’ 사이의 유연한 상호관계 달성을 요구하고 있음. 이는 연구자와 사회 사이의 상호 이해와 지속적 의사소통을 형성하고 유지하여야 함.
-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철학적 비전에 토대를 둔 (a) 과학지식 생산 방식의 전환과 (b) 정책결정 방식의 전환과 (c) 새로운 과학 대중의 등장을 필요로 함.
○ 이에, 본 연구는 과학기술학(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에 기반을 둔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제안하는 이론방법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최근 국제적인 관련 동향에 따르면, 이런 시도를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Science For Policy, SFP)”개념 체계로 형성해가고 있음.
- 그 세부 내용은 (1) 과학지식 공동-생산 모델 (2) 과학자(집단)의 자율성과 정책 지능 강화 (3) 증거-기반 정책 결정 (4) 새로운 과학 시민권 형성을 포함함.
-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모델은 불확실성의 해석하고 연구자와 사회(국민) 사이의 상호 소통과 이해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함. 이는 과학정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설명력을 갖추는 문제이기도 함.
- 연구하기 좋은 환경조성(연구 생태계)에 관한 거시적 미시적 조건에 대한 연구. 대학의 기초연구환경조성 포함.
- 그 외 연구정보 활용 등 국가 주요 이슈와 기초연구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1) 과학지식의 공동-생산 모델
○ 새로운 과학지식 생산 방식이란, 기존의 수요-공급 모델에서 공동-생산(Co-creation) 모델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과학자만이 과학지식을 생산하는 방식 대신에, 다른 행위자(대중, 이해당사자 등)가 참여/개입하는 여러 참여 설계(Participatory design)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음.
- 이들 모델은 전문가와 대중이 공동으로 지식을 생산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협력하게 됨. 과학지식 생산과 평가를 통합하는 효과가 있어서 정책결정의 부담을 감소시켜줌.

[그림 5] 참여 설계(Participatory design) 프로젝트 전개 (Shirk, et al, 2012)
- 공동-생산에 참여한 대중은 직접 관찰자가 되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과학에 대한 주인의식이 증가하며, 정책입안자에게 추가적인 성과평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줄어듬. 과학자(공학자)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는데, 풍부한 연구문제를 수집할 수 있고 대중적 경험을 흡수할 수 있음.
- 과학연구 결과 단계에서도 과학적 결과만이 아니라 사회-생태 시스템 차원과 참여자 개인들 차원의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음. 그 영향력은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에 미칠 수 있음
- 이런 맥락에서 최근 시민과학(Citizen science), 리빙랩(Living lab), 메이커운동(Maker movement) 등과 같은 참여설계 모델이 다수 등장함. 참여 공동 설계(Participatory co-design)가 중요한 연구 분야로 주목받고 있음(Fischer et al, 2018).
- 공동생산자로서 대중은 과학연구의 설명책임성 부담을 완화시켜줌; 대중의 과학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과학의 언어를 일반언어 사이의 간격이 좁혀짐. 과학에 대한 대중의 주인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과학연구의 옹호자가 될 가능성이 높음
(2) 과학자의 자율성과 정책 지능
○ 기초연구 분야에서 과학자(공학자)의 자율성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양적 성과 평가 또는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문화 속에서 과학자의 자율성은 항상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
- 과학연구의 특성에 대한 다수 연구에 따르면, 과학자의 자율성은 과학이론 수립에 결정적임.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2016: 48)에 따르면, 관찰 자체만으로 과학이론에 도달할 수는 없음. “과학이론이나 개념체계는 과학자의 상상력에 정말로 의존”함. 그것은 “속속들이 주관적”임.
- 과학사회학자 콜린스(Collins, 1985)에 따르면, 과학자의 과학연구 과정은 핵심과학자집단(core set)의 내부 동맹과 지원(정신적 정당화)에 의해 유지됨. 따라서 과학정책에서 개인과학자만이 아니라 과학자공동체에 대한 배려도 요구됨. 과학자공동체는 과학의 설명원리(explanatory principle) 즉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토대가 됨.
-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을 보호하고, 기초연구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질적 평가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설명책임성을 위해서 기초연구에 대한 맥락적 설명을 제공하는 사례연구가 요구됨. 기초연구의 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되는데, 이는 과학자(공동체)의 책임성 문제와 연계되어 있음.
○ 새로운 과학 거버넌스에서 과학자의 새로운 역할은 불확실성 관리에 참여하는 것임(Funtowicz and Ravetz, 1990). 특히 과학자는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informed policymaking)에 주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
-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수행하는데, 8가지 전문 기술 역량을 요구함. 이는 과학자(공학자)의 ‘정책 지능(policy intelligence)’을 요구함 (Šucha, and Sienkiewicz, 2020).
- 증거로의 번역 작업에 대한 가치와 전문 기술을 개발하고, 이해하는 역량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 증거-기반 도구와 가이드라인을 개발함으로서 기초연구자와 정책입안자 그리고 대중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음.

[그림 6] 증거기반 정책을 위한 8가지 전문기술 영역 (Funtowicz and Ravetz, 1990)
- 증거는 중요하지만, 증거 그 자체가 스스로 말해주는 것은 없음. 증거는 상호소통 과정에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임. 이 과정에서 과학자와 정책입안자의 역할이 필수적임.
- 증거기반 체계를 위한 전문기술 역량으로는 (1) 정책과 과학에 대한 이해, (2) 개인간 관계에 관한 전문기술 (3) 연구를 종합하는 역량 (4) 전문가 공동체 관리 (5) 과학지식에 관한 의사소통 (6)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7) 시민/이해당사자와 함께 참여활동하기 (8) 정책입안자와 연구자 사이의 기대 차이를 좁이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 이는 기초연구 관리 체계가 갖추어야 할 역량의 범위를 보여주고 있음.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런 전문기술 역량과 그것을 내재화한 관리 체계는 이론적으로 논의되고, 실험관찰을 통해서 실천적으로 학습되며, 그 결과는 정책 가이드라인과 교육 내용으로 전이되어야 함.
- 과학자(공학자)의 정책 지능 개념은 과학자 사회의 자율규제를 함축하고 있음; 자율규제는 과학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면서도, 정부규제의 부담을 줄여주고 유연성을 줄 수 있음.
- 과학자(공학자)의 정책 지능은 사회적 관계 개선과 이해를 포함하므로, 장기적으로 집단적 차원에서 혁신 기술 개발, 사업화 잠재력을 추동함.
(3) 증거-기반 과학기술 정책결정
○ ‘과학정책의 과학화(SFP)’체계에서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informed policymaking)은 필수적 개발 사항임.
-“정책을 위한 증거(evidence for policy)”란, 과학전문성이 없는 청중에게 과학지식을 번역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임. 이는 과학적 과정이 정책 과정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과학과 정책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함)하며, 서로 다른 두 과정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잘 번역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정책입안자는 증거로 번역하는 문제의 프레임을 짜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번역이 필요한 요구 사항, 지식의 차이, 기대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함. 그 과정에 과학자(공학자)가 참여함으로써 번역의 과학적 효과성, 정책의 정당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 정책결정에서 성과평가는 중요한 과정인데, 성과 평가는 단순히 연구자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보다, 문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증거로의 번역을 통해서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이 과학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토론할 수 있음. 따라서 증거로의 번역 문제는 과학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주의에 기여함. 불확실성이 높고 의사결정 부담이 큰 기초연구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에서 증거로의 번역을 통해서 기초연구에 대한 공적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음.
- 전통적으로 증거기반 시스템은 단일 지표(수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예를 들어 논문이나 특허 등. 그러나 단일 지표 시스템은 언제나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위험이 있음. 이제 과학정책의 과학화 프레임워크에서는 복합적인 지표 시스템을 권장함(Funtowicz and Ravetz, 1990).
○ 증거기반 의사결정의 내용으로 연구 성과 평가 활동을 포함됨.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를 포함하여 연구개발비 100조 시대에 돌입,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 과학기술정책 전환에 동의하면서 철학적 기반을 가진 성과 평가 프레임이 요구되고 있음. 기존 양적 평가 지표에만 의존해서는 연구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기 어렵고 대중적 설명책임성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임.
- 이에 질적 평가 방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기초연구자들은 모든 학문분과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경제효과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음. 기초연구는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양적 평가만 적용한다면 연구투자가 어려워지고 연구자들에게도 부담이 됨. 학문분야마다 ‘성공’의 정의를 달리할 필요를 제기함
- 과학연구에서 ‘생산성’은 전체 지식생산에 대한 기여를 의미함. 즉 과학이론은 새로운 설명력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관찰을 유도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질문을 생성함으로서 대안적 이론연구를 자극함으로써 지식 생산을 촉발함(토마스 쿤, 2016). 이런 맥락에서 기초연구에서 ‘성공’이란 전체 과학지식 생산에 대한 기여하는 의미로 재정의되어야 함. 물론 지식 생산성 기여를 설명할 수 있는 맥락적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증거기반 의사결정의 내용으로 예측(Foresight) 활동이 포함됨. 여기서 예측이란, 체계적 참여 과정이며, 중·장기적인 미래를 구성하는 ‘집단 지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함. 그런 집단 지능은 현재의 의사결정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협동 행동을 불러일으키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 특질이 됨.
- 미래 예측은 “탐험 과학에 기반한 기대 예술(the art of anticipation based on science of exploration)”으로서, 현재의 경향,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신호, 잠재적인 발전을 탐색함으로써 미래 결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음. 예측 활동에서‘기대’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게 되며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음. 따라서 예측활동은 데이터분석을 포함하여 맥락적 측면을 포함하여 진행해야 함. 예) 에너지 예측 시나리오 분석(Forecast Scenario analysis) 등
(4) 새로운 과학 대중; 혁신 행위자
○ 새로운 거버넌스는 새 규칙(제도)을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새 규칙을 옹호하고 준수하는 구성원의 존재가 필수적임. 새로운 구성원이란 과학자 집단은 물론이고, 과학의 주체로서 대중 모두를 포함함.
- 대중은 과학자집단과 함께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과학에 개입하게 되며,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감; 그들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도출된 규칙의 구현가능성이 높아짐.
- 대중은 공동-생산 모델에 참여하고, 증거기반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기대하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과학을 요구하고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이 과정에서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 새로운 대중(New public).
- 대중은 새로운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음;‘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을 추동하는 동력은 단지 과학자의 노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 영역을 요구하는 새로운 대중(동원 대중)을 필요로 함(Hess, 2016).
- 이들 새로운 대중은 과학 시민권(scientific citizenship)의 전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됨. 대중은 과학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공동-생산자(혁신 행위자)가 되며, 동시에 과학의 관객으로서 과학의 자기 승인을 완성함.
□ 연구방법론
○ 과학 영향 평가 모니터링 도구 연구 및 개발; 증거-기반 정책 결정의 토대 구축
(a) 사례 연구 (Case studies); ASIRPA (Societal Analysis of Impacts of Public Research) 분석 등 다양한 연구영향평가(RIA) 기반의 사례 연구, 사례 연구 표준화 포함
(b) 영향 경로 매핑 (Impact pathway mapping); 연구활동과 사회적 영향 사이 연속적 단계 추적
(c) 영향 인벤토리 구축 (Impact inventory)
(d) 포트폴리오 분석 (Portfolio analysis)

○ 과학정책랩(Policy Lab) 운영: 과학자와 관련 당사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리빙랩 운영, 과학기술정책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대안적 모델을 참여적 방식으로 설계 개발함.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는 연구/실행 공동체 형성

[그림 7] 대학의 연구 생태계; 다양한 이해당사자
□ 참고문헌
Blair, P. D. 2020. Effective science and technology Assessment advice for congress: comparing options, Science and Public Policy, 2021, 1–13
Calvert, Jane. 2006. “What’s Special about Basic Research?”,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Volume 31 Number 2, March 2006, 199-220.
Collins, H. M. 1985. Changing Order: Replication and Induction in Scientific Practi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uropean Commission, 2017.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Better Regulation Guidelines. (구글검색, 2021. 1. 15).
European Commission, 2017. Better Regulation “Toolbox”. (구글검색, 2021. 1. 15).
Fischer, F., Hmelo-Silver, C. E., Goldman, S. R, & Reinmann, P. 2018. International Handbook of the Learning Sciences, Routledge: New York & London.
Funtowicz, S. and Ravetz, J., 1990. Uncertainty and Quality in Science For Policy, Norwell, MA, U.S.A. : Kluwer Academic Publishers.
Funtowicz, S. and Ravetz, J., 1993. "Science for the post-normal age", Futures, 31(7): 735-755.
Greenberg, D. S. 1967. The Politics of Pure Science: An Inquiry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New American Library: New York and Scarborough.
Group of Eight Australia, (2014). Policy Note: The Importance of Basic Research, (구글검색, 2021. 1. 15).
Hess, D. J. (2016). Undone science: Social movements, mobilized publics, and industrial transitions, Cambridge, MA & London. The MIT Press. [언던 사이언스: 왜 어떤 과학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까?, 김동광·김명진 옮김, 돌베개]
Joly, P.-B., Gaunand, A., Colinet, L., Laredo, P., Lemarie, S., Matt, M., 2015. ASIRPA: a comprehensive theory-based approach to assessing the societal impacts of a research organization. Research Evaluation 24 (4), 440–453.
Kaldewey, D., & Schauz, D. 2017. “The Politics of Pure Science” Revisited, Science and Public Policy, 44(6), 2017, 883–886.
Shirk, J. L., Ballard, H. L., Wilderman, C. C., Phillips, T., Wiggins, A., Jordan, R., & Bonney, R. et al. (2012). "Public Participation in Scientific Research: a Framework for Deliberate Design". Ecology and Society, 17(2), pp. 29.
Šucha, Vladimir and Sienkiewicz, Marta (eds.) 2020. Science For Policy Handbook, European Commission, Joint Research Centre(JRC), Elsevier.